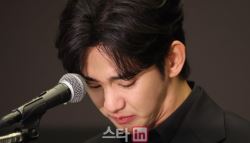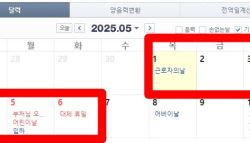결국 시력(視力)이 실력이다. 변화를 먼저 읽고 빨리 올라타는 것이 실력이다. 한국의 AI 산업이 중국 딥시크 같은 AI 기업을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MDMC’가 관건이다.
|
첫째는 맨파워(Manpower)다. 중국의 작은 자산운용사가 만든 딥시크가 세계 1위 기업의 18분의 1 비용으로 1위 기업에 맞먹는 AI 모델을 출시했다. 무명의 딥시크는 올해 1월 20일 이후 62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해 단숨에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수학 천재였던 양원펑 딥시크 CEO는 창업 2년 만에 세계적인 AI 모델을 개발했다. 지금 AI 시대는 괴팍한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한국의 수학·과학 영재들이 공대가 아니라 의대로만 몰리게 만들면 AI는 포기해야 한다.
둘째는 데이터센터(Data Center)다. 세계 AI 산업 순위는 데이터센터의 수와 일치한다. 현재 미국이 1위다. 중국 AI가 미국을 뒤통수 치는 것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데이터센터 수는 미국의 3%에 불과하고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데이터센터를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기피하면 AI는 포기해야 한다. ‘전기 먹는 하마’가 된 데이터센터는 전기와 열 때문에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수다. 한국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 탓에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사이의 이해관계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정리해줘야 한다. 데이터센터 확보를 두고 기업과 지자체의 ‘밀당’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AI라는 차는 지나간다.
◇“HBM 파워 지렛대로 GPU 확보해야”
셋째는 투자(Money)다. 지금 AI 투자는 기업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간 경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그동안 미국에 비해 AI 투자에서 주춤했던 중국은 올해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기점으로 독과점의 족쇄가 풀린 민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AI에 투자한다. 중국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가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3년간 3800억위안(약 75조원)을 투자한다. 알리바바가 투자하면 텐센트, 바이두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올해부터 중국은 AI 민간투자가 붐을 이룰 전망이다. 중국은 AI를 육성하겠다고 벤처업계가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은 유망한 AI 반도체회사가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미국 메타에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지금은 AI 국가대항전이다. 한국은 AI 국가펀드를 만들어 AI 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키운 고기도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AI 반도체(Chip)다. 관점을 달리하면 AI는 문화체화형 산업이다. 각국의 사회, 문화, 역사, 경제, 제도에 적합한 ‘맞춤형 AI(소버린 AI)’는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AI 고속도로를 한국 기업이 깔 수는 없지만 승객의 니즈에 맞는 AI 자동차는 한국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한국 AI 기업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2000개를 가진 곳도 드물다고 한다. AI는 엔비디아 GPU 없이는 안 된다. AI는 이제 기업 기술이 아닌 국가 기술이자 국력이다. 한국은 HBM을 팔아 돈을 버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을 지렛대로 해 엔비디아로부터 첨단 GPU를 확보해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엔비디아 GPU를 일정 비율 우선 배정해야 한국의 HBM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이 ‘슈퍼 갑’ 엔비디아에 대응해 GPU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시장의 최강자다.
◇“2등은 죽는 AI, ‘박 터지는’ 경쟁만”
요즘 세상의 돈은 AI로 모인다. 외국인의 한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AI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AI 관련 기업이다. 중국은 세계 AI 2위이자 시총 2위 국가다. AI에서 등외인 한국의 시총 순위는 16위다.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돈은 한국 AI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2등은 죽는 AI 산업에는 오직 ‘박 터지는’ 경쟁만 있다. 세계 AI 구도는 미국 독주에서 미중 양강으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은 금·은·동메달에도 못 미치는 등외 6위다. 생산성이 높은 52시간은 의미가 있지만, 생산력이 낮다면 104시간 일해도 모자란다.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AI나 AI 인프라산업인 반도체가 아니라 의대로만 몰린다. 한국은 지금 데이터센터 수, AI 특허에서 모두 등외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뛰어넘으려면 ‘발상의 전환과 파격’이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한국의 AI 산업정책에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