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추세 속에서 각국은 기존의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의 산업·안보 전략 차원에서 전력 공급 기반을 재편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다시 ‘원자력’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4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공식화했다. 신규 원자로의 허가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제체계를 개편했다. 향후 25년간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산업 기반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2023년 기준 우리는 연간 270조원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에 달한다. 그 중 전력 생산용으로는 약 55조원의 화석연료를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전력의 약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은 연료비가 전체 발전비용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경우 약 7조~11조 원의 수입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고무적인 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GS에너지, SK 등은 액체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수소 생산용) 등 SMR 분야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에선 민간 기업이 원자력을 통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전히 원자력 산업이 ‘관 주도 독점’ 구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지금은 원자력을 이념이 아닌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한국도 민간이 안정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물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실사구시적이며 지속가능한 원자력 진흥정책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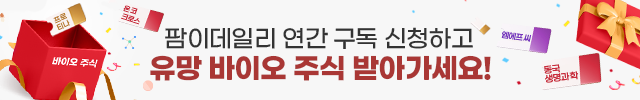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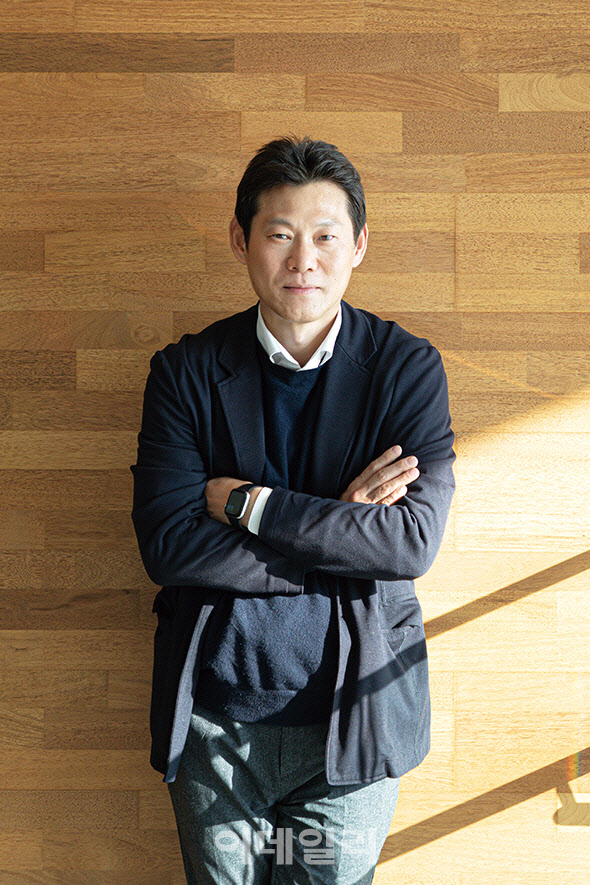



![이재용 나와라…'단체교섭' 쓰나미 덮친 대한민국 미래[슬기로운회사생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200272t.jpg)


![월 305만원 평생…국민연금 대박 비법 보니[연금술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20022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