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주요 국내 유통업체 매출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비중은 54.4%로 1년 전보다 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16.1%), 대형마트(10.1%), 편의점(16.8%) 등 주요 오프라인 업태는 모두 비중이 하락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석 달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고 편의점 업계도 점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전 업태에 걸친 체질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는 실적 부진 점포를 정리하고 매출 상위 점포의 리뉴얼과 신규 콘텐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마산점을 폐점한 데 이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센텀시티점 매각을 검토 중이다. 반면 연 매출 3조원을 넘어선 잠실점은 37년 만의 전면 리뉴얼에 들어가 오는 2027년까지 4조원 규모의 매장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서울 소공동 본점과 인천점, 노원점 등도 순차적으로 재단장에 나선다. 복합쇼핑몰 형태의 ‘타임빌라스’ 전환 전략도 병행 중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서울 본점을 패션·식음 전문관 ‘디 에스테이트’와 고급 부티크 ‘더 헤리티지’로 나눠 리뉴얼했다. 현대백화점은 청주에 이어 2027년 광주·부산, 2028년 경북 경산에 신규 점포를 낼 계획이다. 특히 ‘더현대 부산’은 백화점·쇼핑몰·아웃렛을 결합한 복합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백화점이 지역 랜드마크형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소비자 유입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저수익 점포를 정리하고 식료품 특화 점포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롯데마트는 앞서 인천터미널점과 수원 영통점 등 비효율 점포를 정리했다. 반면 올해 초 개점한 천호점은 식품 매장 비중을 80%로 늘렸다. 이달 말 개장하는 구리점 역시 90%가량을 식료품으로 채운다. 온라인몰과의 가격 경쟁보다 전통적 강점인 식품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흐름이다.
이마트(139480)는 지난해 천안 펜타포트점과 상봉점을 폐점했고, 대신 푸드마켓 콘셉트의 대구 수성점과 서울 고덕점을 연이어 출점했다. 트레이더스는 올해 2월 마곡점을 오픈한 데 이어 하반기 인천 구월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
편의점 업계의 행보도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 출점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펴고 있다. 실제로 CU와 GS25는 올해도 점포를 늘리고 있지만 증가세가 둔화 중이다. 중대형·특화형 점포 중심으로 출점 방향을 재편 중인 영향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지난해부터 부실 점포를 줄이고 있다. 대신 뷰티 등 비식품군 확대와 점포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과거 오프라인 채널이 ‘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작동했다면 이제는 매장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 프리미엄 리뉴얼, 식음 복합 공간, 체험형 매장 확대는 이러한 흐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매장을 방문해야만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이 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된 지 오래다.
유통업계는 점포 수 자체가 더이상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브랜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하나의 점포가 단순히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소비자가 일부러 찾아가는 ‘목적지’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매장 한 곳을 열더라도 매장 동선과 콘텐츠를 소비자 관점에서 기획하고,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인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단순한 상권 대응을 넘어 ‘기억에 남는 매장’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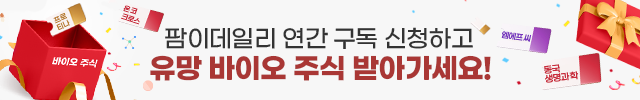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정우성, 비연예인 女와 혼인신고 마쳤나…소속사 측 사적 부분 답변 불가 [공식]](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50006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