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업계에 따르면 hy는 ‘지역상생 플랫폼’을 표방하며 자체 배달앱 ‘노크’의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강서구에서 시작해 현재는 양천구, 강남 4구 등 인근 지역 진출을 모색 중이다. 광고비 없이 업계 최저 수준인 5.8%의 고정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배달앱 상생요금제 차등 수수료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수수료 체계를 앞세운 노크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노크는 올 들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오픈 초기 대비 올해 5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4.8%, 입점 가게 수는 34.7%, 주문 수는 83.1% 증가했다. 아직 전국 단위까지 확장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의 반응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체 시장에서 보면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배달앱 1위 배민과 2위 쿠팡이츠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어서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배달앱의 월간사용자 수는 배민(2169만명), 쿠팡이츠(1089만명), 요기요(489만명)순으로 나타난다. 아직 노크는 서비스 지역과 사용자가 적어 통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노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수수료 상한제와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배달앱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을 예고한 셈이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에 일정 한도를 두는 제도다.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는 유사한 조건의 자영업자에게 임의로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수료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 배달앱은 광고비나 배달대행료 같은 부가 비용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다시금 갈등이 번질 수 있다. 반면 노크는 5.8% 고정 수수료에 광고비나 가입비가 없는 단순한 요금 구조를 갖고 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초기 부담이 적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 hy는 자사 유통망과 방문판매망을 활용해 앞으로 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
|
특히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공공배달·저수수료 민간 배달앱을 키워 기존 배달앱에 긴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다. 땡겨요 역시 낮은 중개 수수료, 다양한 제휴 할인 등을 앞세워 서울 일부 지역에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배달+(플러스)’와 함께 공공 민간 연계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hy의 노크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y 입장에서도 올해는 꼭 노크를 궤도에 올려야 할 시점이다. 론칭 1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노크는 hy가 구상 중인 퀵커머스(근거리 배송) 신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hy는 앞서 2023년 물류 스타트업 부릉(전 메쉬코리아)을 약 8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물류 역량은 노크의 확장성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다만 노크가 좌초한다면 hy의 퀵커머스 전략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물론 노크 앞에 놓인 길은 녹록지 않다. 배달앱 시장은 이미 배민,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이 장악한 상황이고, 사용자·점주 모두 익숙한 플랫폼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 관성도 존재한다. 또 광고비·노출 순위 등에서 기존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프라나 기술력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노크가 저수수료 구조만으로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해선 보다 분명한 차별성과 서비스 품질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 기조가 현실화하면 기존 플랫폼에 큰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다만 수수료만 낮다고 해서 점주와 이용자의 선택을 끌어내긴 어려워 노크 같은 신생 플랫폼이 생존하려면 확실한 차별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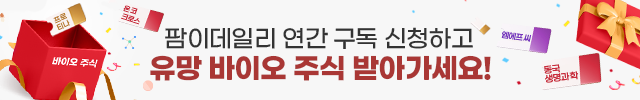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정우성, 비연예인 女와 혼인신고 마쳤나…소속사 측 사적 부분 답변 불가 [공식]](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50006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