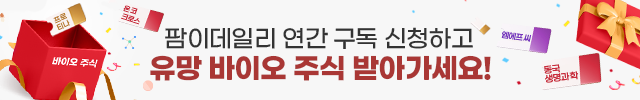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초고령사회의 도시와 건축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첫째, 유니버설 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해 미끄럼 방지 바닥재, 낮은 문턱, 자동문, 휠체어 접근 가능한 주방·욕실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홈 기술과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보행자 우선 인프라를 조성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판과 정보를 제공하며 300m마다 쉼터, 벤치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미끄럼 방지, 교차로 설계, 보행자 안전 강화 등 도시 설계 단계부터 고령자 의견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중심 공동 설계가 요구된다.
여기에 더해 기능성을 넘어 심미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노인 전용’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현대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스마트홈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변화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환경을 제공해 독립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 도요시마구는 거리마다 벤치, 공공화장실, 복지시설과 상점가 연계 등 커뮤니티 중심 도시로 변모했다. 핀란드 탐페레는 교통신호 속도 조절, 전동 휠체어 우선 인프라, 고령자 데이터 기반 공공정책을 펼쳤다. 서울시 은평구는 과속방지 인프라, 쉼터, 미끄럼방지 바닥재, 주민 참여 공동 설계 등 ‘느린 골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책은 시설·설비 개선, 주택 개량 등 시설 단위 대응에 편중해 있어 지역과 지구 단위, 보건복지와 건축·도시 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주거환경은 일반 주택에 비해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넓어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보다 많이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을 만들고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단순히 노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세대공존’의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고령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건복지와 건축 도시 정책을 연계한 지역 단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기반 서비스와 연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의 도시와 건축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연하고 배려 있는 공간,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이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와 건축도시 정책의 융합, 지역 단위의 통합적 접근, 그리고 스마트기술과 헬스케어 솔루션의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