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 같은 효과를 고려해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후차 교체 지원을 통한 내수 시장 방어가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전망치를 기존 915억달러에서 858억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내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단기’ 수요 진작·‘장기’ 미래차 경쟁력 강화
두 번째, 미래차 산업의 국내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023년 전기차 등 미래차 운송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며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돼 투자 여건은 개선됐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전기차 수요 둔화, 내수 침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며 전반적인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완성차 기업과 부품업계의 추가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제 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미래차 분야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현행보다 5% 상향 적용해야 한다. 실제로 반도체 분야는 올해 2월 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한 바 있다.
무엇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완성차 등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돼야 중견·중소 부품업체의 연쇄 투자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조공정 자동화, 로봇 및 인공지능(AI) 응용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특례 적용도 병행해야 한다.
|
국내 완성차 업체는 전용공장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해 왔지만,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투자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완성차 부문에는 86조 3000억원, 부품 부문에는 8조 7000억원이 투자됐으나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1대당 구매 보조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올해 기준 보조금은 승용차 300만원, 화물차 1000만원 수준인데, 이를 2022년 수준인 각각 600만원, 14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를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허용,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전기차 우선 배정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노동 유연성 선결과제…무분별한 파업이 발목 잡아
마지막으로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또는 연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고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 고연봉 근로자는 소득 상위 10% 또는 연봉 1억원 이상(기간제법 기준 7300만원 이상)인 자다. 미국은 연방 노동기준법에서 일정 연봉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직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적용해 초과근로수당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 도입한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연봉 1075만엔 이상 고숙련 직무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자동차 산업이 절대 위기에 놓인 지금 우물쭈물할 여유는 없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에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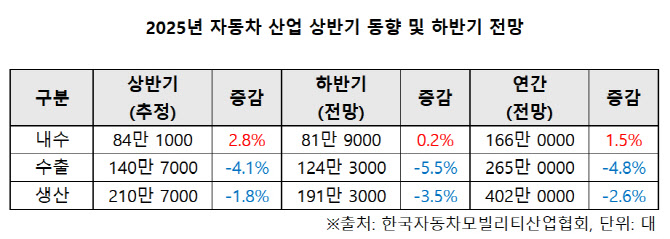


!["엄마, 그놈이 곧 나온대"...끝내 숨진 여고생이 남긴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6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