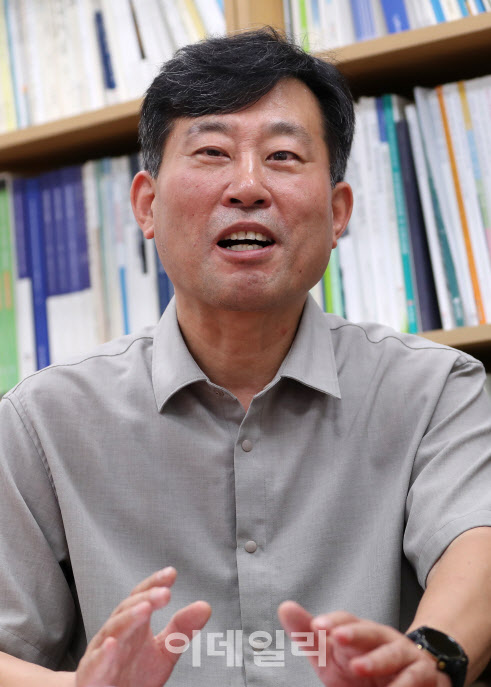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한 총평을 이같이 남겼다. 그는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정착돼 온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과거에 비해 지자체의 역량도 많이 개선됐고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것이 조금은 정착이 돼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갖췄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
이어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력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장 원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더욱이 지금이 세대교체 과도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지방 공무원들 중 70~80%를 차지하던 1960~1970년대생들이 갑자기 대거 퇴직을 하면서 지금은 인사 적체로 인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50대와 40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1960년대생의 빈자리를 젊은 2030대 즉, MZ세대가 대거 들어와 채우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젊은 공무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를 찾아보기 힘들면서 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예전만큼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면서 ‘무사안일’한 조직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게 장 원장의 분석이다.
결국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은 지자체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게 장 원장의 지론이다. 그는 “대부분의 지방 시·군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과잉투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보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등급제로 나눠 차등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기금으로는 특별회계를 통한 매년 1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 10년간 11조원(매년 1조원)을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반회계를 통한 보통교부세 등이 있다. 이에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는 게 장 원장의 주장이다. 아직까지는 기금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로, ‘제2의 교부세’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이 딱 지방소멸대응기금 상반기 5년이 끝나는 시점이고 2027년부터는 하반기 5년이 새롭게 시작된다”면서 “지자체도 하반기 5개년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행안부에서도 하반기(2027~2031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요소를 찾아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올해와 내년의 과제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일본을 지방자치의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원장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개발정책, 지방분권 내용 들은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보다 10~20년 앞서서 다 벌어졌던 일들이고 과도기를 먼저 겪으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제도를 발판 삼아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고향사랑기부제, 법제 등은 모두 일본의 자치행정 사례를 참고해 도입한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