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이 장기 펫보험 상품 구조에 손을 대는 건 펫보험이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펫보험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제도적 미비로 실손보험처럼 허위·과잉 청구가 발생하며 ‘모럴해저드’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고질적 적자 구조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 불능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한다. 정부는 이런 과잉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펫보험은 아직 진료명·진료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비가 천차만별인데다 2008년 도입한 반려견 동물 등록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려견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보험 가입 동물을 다른 동물로 바꿔치기해도 현실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 최근 보험업계에는 자기부담금이 0%인 상품까지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료비 표준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진척이 더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팔려 버리면 실손보험처럼 손해율이 치솟을 여지가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장기 펫보험이 사라지면 펫보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1년마다 재가입하면 장기 펫보험의 메리트는 사라지고 손해율 등이 갱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고객에게 펫보험에 대한 소구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고 했다.
펫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펫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2만 4199건, 2022년 7만 1896건, 지난해 16만 211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펫보험 비교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다만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약 1.7%다. 이는 스웨덴(40%), 영국(25%), 미국(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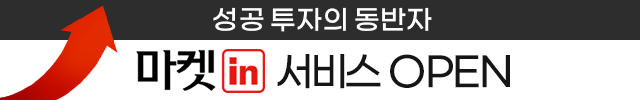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아들집 좀 갔다고 며느리가 연락차단,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4/PS2504120027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