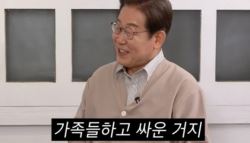|
이씨는 1997년 서울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를 재개발업자 2명에게 처분한 뒤 캐나다로 떠났다. 당시 부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으나, 해방 후 국가에 의해 환수됐다. 이후 이윤형 씨가 조상 땅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이씨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1평)당 400만~4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매가는 30억원에 달한다. 이 땅은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에 1801필지, 총 2233만4954㎡(676만8168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로, 이완용이 보유했던 부동산의 0.05%에 불과했다. 이완용이 해방 전 토지 대부분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부는 토지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후손의 손으로 되돌아갔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한 인물로, 조선이 망하는 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1910년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고, 1919년 3·1 운동 진압을 대가로 후작으로 승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