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팀, 워싱턴 집결 후 美상무장관과 협의
30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에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합류해 상무부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2시간가량 협의했다.
|
양국은 30여시간 후인 오는 31일(현지시간)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협의에서 사실상 최종 담판을 벌인다. 미국이 현재 10%를 부과 중인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시점인 8월1일 하루 전이다.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미 가능한 모든 카드를 전달한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냐’는 반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 등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 후 김 장관, 여 본부장 등과 최종 담판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미 실무진 간에도 마지막 협상을 위한 실무 논의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진행·발표한 내용을 묶어 2000억달러 안팎의 투자 약속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쌀·소고기 수입 확대, 정밀지도 반출 등 미국 측이 요구해 온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도 대부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국회도 이번 협상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해오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일시중지’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계 반발을 고려하듯 양곡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높아진 美 눈높이에…추가 카드 고심
문제는 이 같은 한국의 제시안이 한껏 올라버린 미국의 눈높이에 맞겠느냐는 점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EU는 이번 협상을 위해 3년간 7500억달러(10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과 6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총 1조 3500억달러 규모의 ‘선물’이다. 일본 역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더해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카드를 제시했다.
한국 입장에선 경제규모의 차이가 큰 곳과의 직접 비교가 불합리할 수 있다. EU(19조달러)와 일본(4조 2000억달러)의 GDP는 우리(1조 7000억달러)보다 각각 11배, 2.5배 더 크다. 일본이 연 GDP의 약 13%인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약속을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2200억달러가 최대치다.
더욱이 일본은 직접투자 외에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을 포함해 결과를 부풀린 반면, 한국은 한미 조선협력 계획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처럼 더 실질적인 투자 및 기술·인력협력 패키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EU와의 협상 후 가장 자랑했던 게 투자 규모”라며 “미국도 타결 의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지금껏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8월 되면 더 불리…최선 다해야”
미국 측 압력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15%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만큼, 현재 내놓은 안을 잘 포장해 경쟁국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 대부분은 상호관세 부과 전 포괄적 협상 타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 교수는 “너무 휘둘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8월1일 25%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앞으로 더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은 앞으로 완전한 경쟁국이 될 것이기에 우린 어떻게든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선에서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실질적으론 안보와도 연계된 만큼 일본, EU처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약속 등을 더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 원장은 “일본과 EU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협상 기타결 국가 대부분의 협상 내용에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와 함께 무기 구매 확대 약속이 담겨 있다”며 “우리도 안보와 연계해 이 같은 새로운 제안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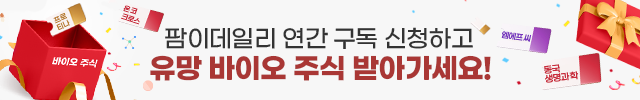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단독]'완전체 재결합' 피에스타, 데뷔 13주년 기념일 맞춰 컴백](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260012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