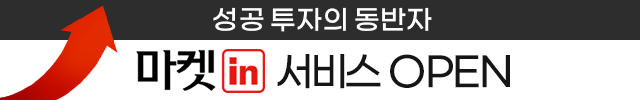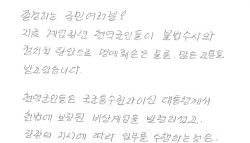실제로 미국의 경우 공공조달은 ‘U.S.C.(United States Code) Title 41’에, 국방조달은 ‘U.S.C. Title 10’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근거로 방위사업계약법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에 맞는 규율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연방조달규칙(FAR)과 국방연방조달 보충규칙(DFARS)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타거래권한(OTA)이 대표적이다. 이는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프로젝트 설계와 시행을 위한 제도로 연구의 수행, 프로토타입의 개발, 성공적인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 따른 후속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계약에 사용된다. 도전적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방위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제도인 셈이다. 또 미국은 민간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특히 일반 공공조달 분야의 계약 체결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와 방위사업 분야의 계약 체결 이후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구분돼 있다.
|
특히 미국의 경우 공공조달 지체상금 운영 기준이 이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유연성이 높아 국방조달에 예외를 두지 않아도 재량에 맞춰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계약공무원은 지체상금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도전적연구개발 성실수행 시 지체상금 면제사유를 내부 규정에 반영했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감사에 대한 책임 부담 등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역시 국방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방위사업 분야는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해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도록 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