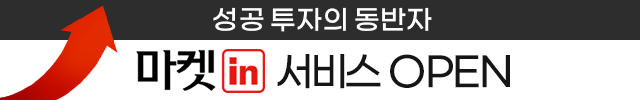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산업계도 그렇다. 움츠린 만큼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다. 정부도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고 ‘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며 여러 제도적 장치와 지원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자주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갑작스런 물류망 폐쇄 및 공장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따라서 이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집에서 업무를 보고 공장과 설비에 원격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산업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은 반드시 탄탄한 보안과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 가능한 탄력성과 복원력 그리고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는 산업을 변화시켰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효율성, 탄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는 동시에 반드시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2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은 역시 디지털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산업의 디지털화는 급물살을 탔다. 디지털 혁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화는 산업의 일부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금융과 유통, 석유화학까지 모든 산업을 관통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 산업 플랫폼은 혁신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형이 됐다. 지금의 필요한 건 오히려 속도다.
물론 기존의 시스템에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연결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따르는 작업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에 기술을 더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째로 대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비즈니스가 지닌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기존의 설비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보다 나은 데이터를 제공해 위기를 사전에 대응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디지털화의 핵심이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이것이 마지막 고비가 아닐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비즈니스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탄탄한 정비를 해야한다. 안정적인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다시금 푸른 생기가 채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