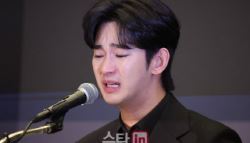|
인간은 이전부터 무리를 짓고 편을 가르며 집단을 만드는 본능이 있다. 이는 인류가 많은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생활이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전자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단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적으로 간주하며 적대감을 갖게 되고 때론 공격을 하게 된다. 스포츠의 경기가 대부분 공격과 수비가 있는 것도 국가라는 집단의 작은 전쟁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은 따지고 보면 하나 둘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다양한 인종, 국가, 직업, 종교, 정치적 성향, 여러가지 단체, 스포츠, 출신학교, 출신지역, SNS 친구들 등등 많은 집단에 속해 현대인들은 살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위협을 받으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는 뇌의 후측두엽의 상피질(posterior temporal cortex)과 연관된 신경회로와 관련성이 높다고 미국의 듀크대학 연구팀은 주장하였다. 이는 후천성이 아닌 인류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선천적인 본능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대다수의 전쟁은 집단이기주의로 부터 발생하였다. 전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서의 댓글달기나 정치적 대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듯 하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할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뇌가 느낀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은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인종, 성별, 국가 등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 의해 변할 수 있다. 그 틀은 내가 세상과의 만남에서 얻은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식은 경험을 벗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서 겪은 경험은 모두 뇌의 전두엽과 해마에 저장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점화되 듯이 떠오르게 되어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두엽은 의식이 자리하는 곳이며 인간의 모든 경험의 엔진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여 남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집단에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큰 집단으로 소속을 옮기는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올림픽 경기에서 국기를 흔드는 행동은 우리가 더 큰 집단에 소속된 것을 일깨워주는 한 예이다.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박수를 쳐 주는 것도 우리가 같은 지구인이라는 소속을 알게 해준다. 정파를 따지는 것보다는 더 큰 국가로 소속 집단을 옮기고 더 나아 지구에 같이 사는 같은 인간으로 소속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인류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조성진 교수는...
△조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의학박사 △현 대한 두개저학회 회장 △현 대한 뇌종양학회 상임이사 △현 대한 방사선수술학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