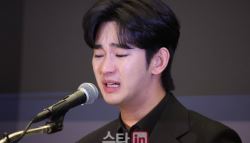|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하면서, 세입자(한국에너지공단)의 전세보증금 2억원은 B씨가 인수하고 매매대금(2억8000만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체결했다. A씨는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받고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B씨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에 필요한 조치(세입자의 동의 등)를 취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결국 임대차 계약 만료 후 B씨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보증보험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이 원래 집주인이었던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패소하여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억울했던 A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 C씨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공인중개사 C씨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점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책임 비율 50%). 매도인 A씨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지 여부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C씨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먼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성립하도록 돕는 사실행위이지, 변호사처럼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률사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인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문제, 즉 이것이 매도인의 책임까지 완전히 면제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인이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인수’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나 동의 여부 같은 복잡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았다.
전세를 낀 부동산 매매는 편리한 만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도인이 ‘보증금 인수’ 약정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거액의 보증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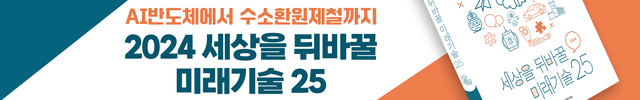
![[헌법학자 긴급설문]尹탄핵 선고 결과…'인용' Vs '기각' 엇갈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4/PS2504020015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