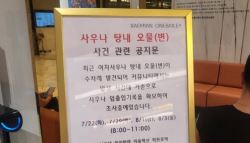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
A씨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2022년 2월 7일 약 50여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B회사 전 이사였던 C씨를 지칭해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C이사는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며 “C이사는 고졸인데 MIT는 학력위조”라는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방 목적과 관련해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주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됐고,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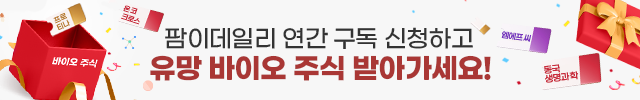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모텔비 얼마?" 반말에 욱해 살인...감옥서도 교도관에 '박치기'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8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