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극한의 진영 대결과 정치적 양극화가 한 차원 높은 국론 분열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소위 ‘개딸’(개혁의 딸)과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불리는 양 진영의 극단적인 지지층을 주도적인 정치 세력으로 키우고, 중도층에게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심어줬다. 새 정부는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정 마비됐던 尹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새 정부는 우선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배척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초당적 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맞불을 놨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은 물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시점인 정부 출범 약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야당의 계속된 파상 공격에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파면당했다.
당연하게도 정치의 실종은 국정 마비를 불러왔다. 실제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42차례나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합한 것(16회)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정부 입법(623건) 중 197건이 처리돼 정부입법 통과율은 31%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의 극한 대립으로 주요 개혁 과제가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협상과 타협,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며 “다수결은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지 절대 가치는 아니다.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탄핵의 강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로 꼽힌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 대한 정치 보복은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같이 정권 초반에 적폐 청산과 같은 행태를 반복하면, 결국 정권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사 출신이자 5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통합 정신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우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파란 옷이든 빨간 옷이든 승패를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고, 선거제도 및 정당 개혁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개헌안에는 현행 5년 단임제 형태의 정부를 4년 중임제·연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으로 정부 형태를 바뀌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또 현행 승자 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신 교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주의는 물론 정당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각제를 도입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개혁이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 한쪽 진영에서 이를 바꾸는 데 독주하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적 저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생각과 여론을 살피고 개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국내 정치를 바꾸더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우선 순위를 잘 짜는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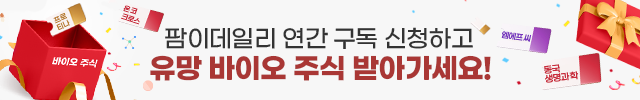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연금 월 300만원 비법?" 50대는 '반납'하세요[연금술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90035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