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올봄 이를 기념하여 그 때의 귀향 일정에 맞추어 같은 날짜에 행사를 재현하며 뜻을 되새기려 한다. 당시 퇴계는 배와 말을 타고 갔으나, 이번에는 같은 여정을 도보로 걸으면서 남긴 시를 음미하고 의미를 되짚는 강연도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시기는 산천이 꽃과 신록으로 한참 물들어갈 4월 9일부터 21일까지이다.
출발지는 서울 강남에 자리한 봉은사로 잡았다. 봉은사는 퇴계가 임금을 하직한 뒤, 경복궁을 나와서 한강변 정자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묵은 곳이다. 첫날 묵었던 정자가 지금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봉은사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강연회를 열기에 적합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만 38만명인 봉은사로서는 큰 공간을 반나절이나 외부행사에 할애해야 하는 일이어서 과정이 간단치 만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직접 발품을 팔고 지인들의 도움도 얻어 450년 전 그날 그때(4월 9일 오후 2시) 그곳 봉은사에서 주지스님의 축사까지 포함하여 강연회를 열면서 이번 귀향 행사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출발지가 봉은사라는 사실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교훈을 주는 퇴계의 여러 처신 가운데 이곳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점이다. 퇴계 당시의 불교계는 조선 건국 이후 숭유억불 정책의 여파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명종의 생모인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시적인 융성기를 맞고 있었다. 퇴계의 장·노년기와도 겹치는 이 시기에 그런 움직임의 한복판에 있던 사찰이 바로 봉은사였고,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보우선사(1509년 ~ 1565년)였다.
기자 Pick
퇴계의 이런 지적에 따라 고향 예안과 안동의 선비들은 대궐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 유림의 요구는 그치지 않았고, 그 결과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을 가서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4년 후 퇴계는 바로 귀향길에 보우가 활동하던 그 봉은사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봉은사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퇴계 선생의 감회가 어땠을까? 또 당시 봉은사 스님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로부터 450년, 봉은사와 보우선사 그리고 퇴계 선생 간에 얽힌 의미 깊은 옛날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지스님과 필자는 예정된 면담시간을 두 배나 늘려가며 따뜻한 눈길을 쉼 없이 주고받았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적선의 인연이란 이렇게 이어지는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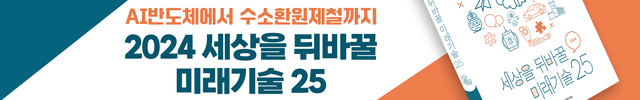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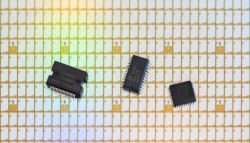



![26년전 관객 600만 동원한 그 영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2/PS2502130000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