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3대 독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며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싶어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됐고, 이 남성은 오래 전 사별한 뒤 홀로 자식들을 키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합의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성은 병을 얻은 뒤 투병 끝에 사망했고, 아픔을 잊을 새도 없이 A씨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A씨와 함께 살던 남성의 자녀들이 찾아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것. 이들은 아버지와 A씨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며 A씨를 내쫓으려 했다.
A씨는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며 “단장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A씨의 경우 10년 동안 함께 살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거가 있을 시 사실혼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된 배우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즉 A씨가 아닌 전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던 집이 남편 소유의 자가였는지, 전세였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후 그 집은 남편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전셋집이었다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 관계를 승계받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동일한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증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임 변호사는 “A씨와 남편만 함께 살고 있었기에 전혼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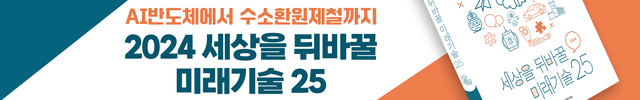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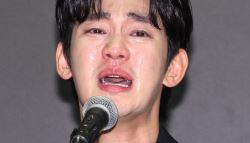
![김수현, 퇴장까지 눈물…김새론 언제 만났냐 질문에 보인 반응 [뒷얘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3/PS250331001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