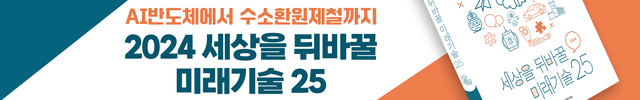|
반면 심사처리기간은 2020년 11.1개월에서 2021년 12.2개월, 2022년 14.4개월, 2023년과 지난해 모두 16.1개월을 기록하는 등 처리기간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는 청구 물량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누적된 물량으로 심사처리기간 지연 사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위기인 셈이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 등 특허행정 서비스의 주요 고객들은 특허를 통한 조기 권리화를 위해 보통 ‘12개월 이내’ 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의 우선권주장출원 이점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서도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10개월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지연된 수치로 글로벌 기술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및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특허 심사처리기간(1차)을 보면 일본 9.5개월, 중국 13개월, 유럽 특허청(EPO) 5개월 등으로 미국(20.5개월)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16.1개월)에 비해 빠르게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은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된 이유는 특허청이 심사 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무리하게 단축했고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축소했다”며 “대상축소로 인해 우선심사물량이 전년대비 15% 줄어든 영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가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고강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재심사착수 처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우선심사 추가 지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심사관 승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심사관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동승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국 주무심사과를 제외한 일반심사과 부서장의 한시적 추가 심사 처리를 통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심사국 내 베테랑 심사관인 4.5급 심사관에게 10% 추가된 물량을 배정해 처리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4.5급 특허팀장을 심사과 품질담당관으로 지정, 심사·심판 주요 사례 분석·전파, 심사관에 대한 멘토링 실시 등 부서단위의 품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분야 심사처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심사관 105명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 60명을 추가로 증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과 발명자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인력 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로, 상표심사처리기간도 12개월로 단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명품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