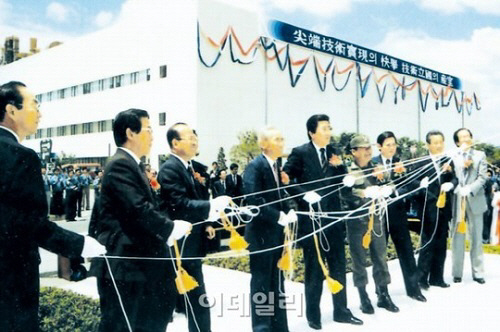|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빈곤에 허덕이는 겨레 여러분, 우렁찬 수레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울산 시내에는 산업화의 상징 ‘공업탑’이 있다. 지난 1962년 2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산공업단지 기공식 때 했던 연설이 탑에 새겨져 있는데, 요즘 눈으로 보면 어색하기 그지 없다. 수레 소리와 검은 연기는, 지금으로 치면 소음 공해와 미세 먼지라고 할 수 있다. 그걸 바랐다는 박 의장의 연설은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짐작케 한다. 1962년 그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91.0달러)은 100달러도 안 됐다.
한국경제통사(이헌창 저)에 따르면 식민지 시절 경제가 가장 좋았던 1941년 수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회복된 게 1968년이라고 한다. 6·25 전쟁 잿더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 1억달러 돌파에 환호했던 1964년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7.0달러에 불과했다.
◇불과 60여년…전세계 최빈국서 선진국 언저리로
‘고속성장 신화’의 대명사인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67.0달러) 이후 무려 444배 증가한 것이다. 전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언저리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60여년이다.
다만 이제는 성장을 보는 시선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적 성장에 도취될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국민계정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달러에 근접한 2만9745달러(3363만6000원)로 나타났다. 2016년 2만7681달러(3212만4000원)보다 3.1% 증가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3만달러를 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GNI는 한 나라의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국민소득 증가는 곧 생활 수준 향상을 뜻한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경제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대수명이 늘고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하는 게 성장의 대표적인 방증”이라고 말했다. 딱 우리나라 얘기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다가, 1000달러(1977년·1047.0달러)와 1만달러(1994년·1만168.0달러), 2만달러(2006년·2만794.7달러) 벽을 빠르게 허물었고, 그 사이 건강 복지도 함께 좋아졌다. ‘한강의 기적’이다.
특히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으면 골프를 치고, 3만달러를 넘으면 승마를 하고, 4만달러를 넘으면 요트를 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3만달러의 의미는 또 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30-50 클럽’의 7번째 멤버를 예약했기 때문이다. 현재 30-50 클럽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만 가입해 있다.
|
◇“‘풍요의 시대’가 웬말? 도저히 체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풍요의 시대’를 체감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적잖게 나온다. 3만달러 시대라면 4인 가족의 소득은 1억30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름의 일리가 있다. GNI는 가계 외에 기업과 정부가 번 돈도 포함된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아도 기업소득이 늘거나 정부곳간이 두둑해지면 GNI는 증가한다. ‘GNI의 착시효과’다.
그래서 더 주목되는 게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다. PGDI는 가계의 근로·재산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뺀 것이다.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PGDI는 1만6573달러(1874만2000원)였다. 4인 가족 기준으로 7500만원 정도다. GNI 기준과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3만달러 시대에 도취되기에는 경제 밑바닥은 여전히 차갑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새 먹거리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만달러까지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으로 가능했지만, 그 이상 가려면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따라잡는 식의 ‘캐치 업(catch-up)’은 이미 중국 등이 더 능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