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데이터를 활용, 배우자 사별 이후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배우자를 잃은 뒤 첫 1년간은 외로움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원래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사별 전 배우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 사별 후 외로움이 심화됐으며 이러한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됐다. 연구팀은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 몫으로 여겨졌던 돌봄을 수행했던 남성들이 사별 이후 더 큰 상실감과 정서적 공백을 겪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 돌봄 여부와 관계없이 사별 직후 일시적으로 외로움이 증가했지만,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여성이 사별 후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성별과 돌봄 역할이 사별 후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년층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두뇌한국(BK)21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노인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Innovation in Aging’ 4월 15일 자에 게재됐다.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인 김진호 교수는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남성 돌봄 경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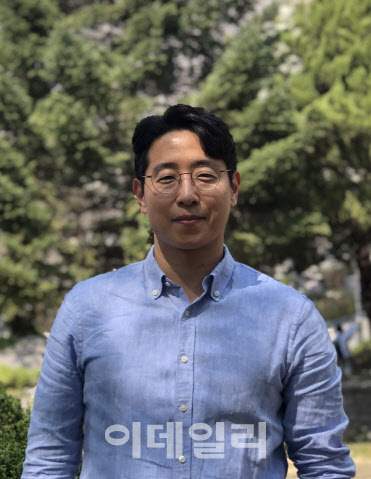


![‘신랑수업' 받는 장우혁, 알고보니 청담동 이곳 건물주[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2700038t.jpg)
![“이재명표 눈치라면?”…하림 ‘맛나면', 먹어보니 진짜 그 맛[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270003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