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하청업체 소장은 공작작업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해선 모두 재해자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공작실 작업자는 사실상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설명에 따르면 고인이 쓴 범용 선반은 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었고, 회전부에 끼이는 사고가 잦아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방호울 설치가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다.
공작물 고정 역시 장비 부적합으로 부실하게 이뤄져 고인의 신체가 회전체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원청인 KPS와 하청업체 사이 계약서에는 작업 전 서면 작업지시와 위험성 평가, TBM(작업 전 안전회의) 등의 절차가 명시돼 있었으나 고인 작업은 구두지시로 이뤄졌다.
대책위는 “작업절차는 작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안전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예외적인 긴급작업, 돌발작업 시에만 가능한 직접적인 구두 통보를 통한 작업지시가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6년전 태안화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도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인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김용균 이후 정부와 발전사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이행점검을 하는 동안에도 안전시스템의 작동은 원청과 김용균이 소속된 1차 하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 등 요구사항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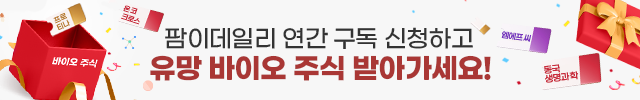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연금 월 300만원 비법?" 50대는 '반납'하세요[연금술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90035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