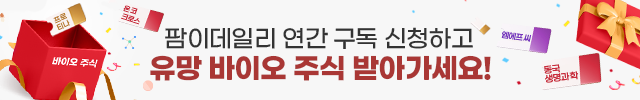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주택 10건 중 1건만 착공에 성공했을 정도로 성공률이 낮다. 작년말 기준 서울 지주택은 118개인데 이중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11.9%)에 불과하다. 서울 지주택 중 조합이 파산하거나 모집을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례도 9개나 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총 618개로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모집신고 단계’에 있는 지주택이 316개, 전체의 51.2%에 달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제도다. 청약 저축통장이 없어도 주택 매수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시행해 절감한 사업비로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졌다. 첫 삽도 못 뜨고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는 것도 문제지만 착공을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지주택은 ‘무조건 당첨, 시세 절반 내집 마련’ 등 과장된 광고로 시세대비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놓고선, 입주 직전에 공사비를 평균 30% 이상 과도하게 추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주택을 통한 주택 공급 자체가 쉽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택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며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민간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곳은 공공 부문밖에 없다”며 조합 등 민간의 토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