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결과 한국 유아는 전 시점에서 미국 유아보다 밤 수면 시간이 짧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유아와 비교했을 때도 생후 12개월과 24개월 시점에서 한국 유아의 수면 시간이 더 짧았다.
이는 서구권보다 아시아권 유아의 수면 시간이 짧고 취침 시각이 늦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 기존에는 문화권별 차이를 학령기 이후의 학업 경쟁이나 사교육 등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연구는 수면 격차가 생후 1년 전후부터 이미 시작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생후 12개월 시점에 한국 유아는 미국·호주 유아보다 하루 평균 약 74분 더 적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7시간 이상이다.
연구팀은 부모의 수면 건강 문제도 함께 다뤘다. 조사 결과 한국 유아의 약 33%가 수면 중 보호자 개입이 필요하거나 밤중에 자주 깨는 등 수면 문제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호자의 수면 부족과 야간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한국 산모의 불면증 증상비율은 미국과 호주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아이의 수면 부족은 곧 부모의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수면 학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진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생후 12개월 기준으로 한국 부모의 85%는 아이와 함께 자는 ‘코슬리핑(co-sleeping)’을 택했다. 반면 미국은 6%, 호주는 31%였다. 코슬리핑은 유아와 보호자 모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생후 6~8개월 이후에는 유아의 자율적 수면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
서수연 교수는 “한국의 유아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 비해 수면 시간이 짧고 산모들이 더 많은 불면 증상을 겪는 현상은 사회 구조와 연결돼 있다”며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야간 육아 부담과 아버지의 늦은 퇴근으로 인해 유아의 취침 시간이 지연되고 독립적인 수면을 방해하는 코슬리핑 중심의 수면 환경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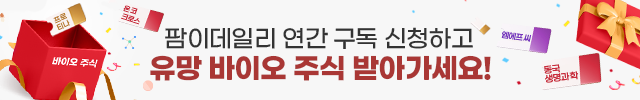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1500m 뛰고 격투기까지…못하는 게 뭐야?[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8/PS250815006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