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씨네 백반집의 반찬 가짓수는 5~6개.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메뉴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물가 변동에도 대응하고 있지만 ‘인기 반찬’ 재료의 가격 변동엔 속수무책이다.
특히 농작물은 이미 면세인 경우가 많아 재료비가 늘어도 연말 세액공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재료비 상승이 고스란히 순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한국인 밥상 1순위였던 한식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식당 비중은 2018년 45.6%에서 2019년 45.0%, 2020년 44.2%, 2021년 43.6%, 2022년 42.9%, 2023년 42.6%, 2024년 41.8% 등으로 매년 감소세다. 여전히 한식당 비중이 가장 높지만 조만간 40%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식이 빠진 자리는 일식, 서양식, 중식과 함께 피자·햄버거·샌드위치나 치킨점 등이 채우고 있다. 전체 외식업체에서 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5%에서 지난해 2.6%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서양식과 중식은 각각 1.7%에서 2.4%, 3.5%에서 3.9%로 늘었다.
이 같은 한식당 감소세에는 농작물 가격 상승 외에도 여러 가지 경영 애로사항이 영향을 끼쳤다. ‘맛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맛으로 단골 수요를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한식을 찾는 전체 파이 자체가 줄어 식당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낙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모(60대) 씨는 주요 메뉴의 가격을 1만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살아남고 있었다. 주요 고객층인 직장인들은 점심 비용에 8000~9000원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다.
권씨는 “고정비용이 다 올라서 어느 가게나 힘든 건 마찬가지”라면서도 “한식은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적정 가격 선이 낮은 것 같다. 같은 재료 값을 쓸 때 생소한 음식은 가격을 높게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한식은 그냥 안 먹고 만다”고 전했다. 물가가 올라가면 한식 소비 비중이 더 빠르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냉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김경원(51) 씨는 “반찬 가짓수가 많으면 (홀이든 주방이든) 당연히 할 일이 늘어난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인건비를 더 많이 줘야 고용할 수 있다. 주변 둘러보면 백반집 직원들은 50~60대 아니냐”고 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시행한 세액공제 확대도 내년부터는 종료된다. 정부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10% 확대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올해 12월을 끝으로 사라진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확대했는데 내년 말 종료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사람들이 한식만 찾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음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며 한식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한식은) 식재료비가 오르면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고정비용의 상승과 음식 가격 상승 폭을 고려했을 때 한식은 이익을 얻기 좋은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최 교수는 “외식 소비를 과감하게 하는 젊은 층에 비해 한식을 주로 소비하는 연배 있는 세대는 외식 비용을 좀 더 절약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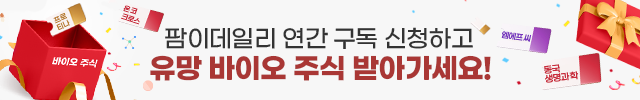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단독]당정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10억' 與에 통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2001230t.jpg)



